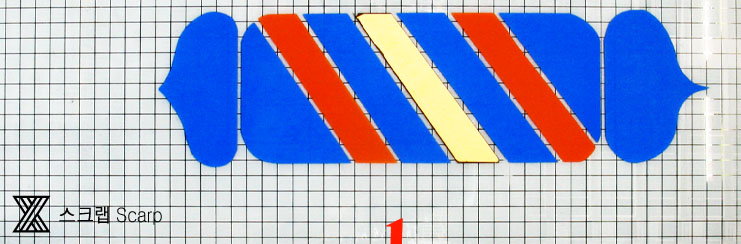‘경영구루’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씽커스50(http://www.thinkers50.com/)에서 ‘2009년 올해의 구루’로 꼽힌 CK 프라할라드가 창업의 길을 떠났다. 게리 하멜과 함께 금세기 경영 패러다임을 바꾼 책으로 평가받는 <경쟁의 미래(The Future of Competition)>를 저술했고,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와 명성, 그리고 부를 누리던 그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찾아나선 것은 ‘바닥’에 있는 세계 40억 인구 때문이었다.
프라할라드의 눈에 비친 빈곤과 가난에 지친 40억 인구는 단순한 원조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프라할라드의 눈에 이 40억 인구는 소비자요, 기업가요, 혁신가다. 프라할라드는 이에 대해 이미 ‘저소득층에 투자하라’(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는 그의 논쟁적인 저서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말한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가 절정에 이른 상황에 다소 모험이라 할 수 있는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할라드는 건전하게 미친 것일까.

by Wen-Yan King, http://www.flickr.com/photos/38225109@N00
웹 2.0이 유행하기 전에도, MIT 슬론경영대학원의 에릭 폰 히펠 교수는 <혁신의 민주화(Democratizing Innovation)>란 책에서 MTB 등 주요한 혁신이 기업의 고비용 R&D 센터에서가 아니라 유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즉, 유저혁명 그리고 유저신화란 웹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한정된 인구에 허용되던 그 창조와 혁신의 기회가 웹이란 개방적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그 이전의 산업계를 뒤흔든 ‘인간의 창조성이란 본능’, 그 기본적 역량이 가난에 의해서 종말된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프라할라드의 말처럼 지구촌 바닥 40억 인구의 역량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조건 원조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숨겨진 소비자요, 기업가요, 혁신가다. 달리 말해 제3세계의 가난을 종말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은, 제3세계의 잠재력,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데 있다.
실례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대표주자 방글라데쉬 무하마드 유누스의 그라민뱅크가 최초로 투자한 그라민 빌리지 폰은 MIT 슬론경영대학원 출신인 이크발 카디르가 휴대폰이라는 IT를 통해서 방글라데쉬의 시장 인프라를 개척한 사건이었다. TED 강연에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 이크발 카디르가 출연해 널리 소개된 바 있는 이 케이스는, 국제적으로 일방적 원조보다 더 효과적으로 국제개발의 성과를 드러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혁신이 만들어 낸 접속성의 향상은, ‘거리’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산성을, 그리고 그 생산성은 기업가 정신과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 향상을, 그리고 동 떨어져 있던 제3세계 국가가 세계 시장과 하나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휴대폰이 아니라 좀 더 큰 스케일과 긴 안목으로, 웹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앞세워 빈곤 문제의 해결에 도전해볼 수는 없을까. 애초에 웹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된 이유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다. 기술이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창조력,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한 웹플랫폼 상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창조력이 만들어내는 생산성 때문이었다. 그 생산성의 선물이 저개발국가에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제개발에 관심을 갖자는 것은 단순한 호의와 연민의 감정때문만은 아니다. 프라할라드의 말처럼, 발전의 한계에 이른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황에서, 세계시장의 성장이란 바닥에 있는 40억 인구가 일어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소비,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성에 21세기 이후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웹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앞장선 사람들이 있다. MIT의 공개강의운동 ‘오픈코스웨어’는 이미 1,900개 강의를 공개해 저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학생에게도 뻗치고 있다. MIT 옛 미디어랩 소장이었던 니콜라스 네크로폰테 교수가 진행하는 ‘OLPC’(One Laptop Per Child: 제3세계 국가 아이들에게 저가의 노트북을 공급해 교육 인프라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육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끓자는 운동)은 그 수혜의 범위를 날로 확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가상공간 비즈니스 모델의 선두주자 ‘세컨드라이프’를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회원들의 국가로 최근 브라질이 올라왔다. 세컨드라이프 사용자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게 브라질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세컨드라이프에서 비즈니스로 얻은 수익을 미국 달러로 환전할 경우, 본국에서 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환율 등을 고려할 때 더 많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국제개발이라는 의도로 시작한 전자의 사례들과 다르게 후자의 세컨드라이프 사례는, 웹의 진화가 국제개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게 한다.
사람이 기술을 닮아갈까. 기술이 사람을 닮아갈까. 결국 기술도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유저 경험, 유저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그리고 사람을 닮아가는 기술, 현실을 닮아가는 웹생태계는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은, 만약 제3세계에 충분한 접속성의 인프라가 보급이 된다면 제3세계의 현실과 제1세계의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그들의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웹생태계의 진화에 관해서는 2009년 12월 1일 월요일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메타버스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이용수 Tri-d communications 대표의 기조 발언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미래 웹의 진화와 웹진화를 통한 현실-가상현실간의 경계변화, 제3세계와 제1세계의 접촉점의 변화가 가속화, 대량화된다면 그것이 국제개발과 맞물리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 같은 수준의 사회적 웹 (Social Web)은 아직 일반화,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전망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웹이 국제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방법들이 무엇일 수 있을 지 헤아려보게 한다.
제3세계에서 출발하여 최근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까지 위상이 올라 간 대한민국은 저개발국가였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동안 받았던 원조의 혜택을 세계에 돌려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제개발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I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단순 ODA(Official Development Aid,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넘어서 지식전파, 공유에 힘쓰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 상기의 웹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한 기술과 문화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제3세계의 접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IT기술과 인력,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인력,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윈윈 게임의, 선순환적인 국제개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웹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섣불리 결론내리기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러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기에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