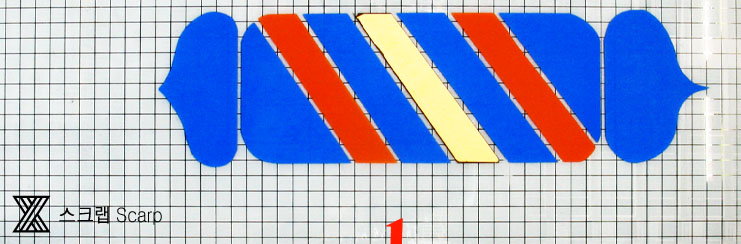|
나는 아직도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어려서 다닌 교회에서는 거듭남[重生]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교회에 처음 나간 건 열한 살 때였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해 싸우다가 조지아 주 올버니에서 구속됐는데, 그게 나한테는 정말로 거듭나는 계기였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손을 보네, 새로워졌네. 내 입을 여네, 새 말을 하네. 걸음을 걷네, 새 길을 걷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때 그 새로운 맛을 내 입 안에, 내 삶 속에 간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의식 있는 시민이라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 말할 길을 찾아야 해’라는 말을 좌우명 삼아 도전적 자세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올바르거나 종식돼야 하거나, 둘 중 하나죠.
삶에서 나의 행동은 내가 내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해 줍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공간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속한 체제, 내가 지지하는 체제 전체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체제의 균형이 깨지면, 그건 저기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균형이 깨진 것이나 다름없지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체제의 현 상태에 한몫 한 것이고, 이건 좋다든가 이건 미쳤어, 바꿔야 해, 하는 식으로 체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살지 않는 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신(神)을 닮았다는 건 인간의 자아도취
이틀 전에 한 강연에서, 인간이라는 종(種)이 진화 단계상 그다지 높은 게 아니라고 했더니 다들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인간의 진화 단계가 높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높은 단계까지 진화한 거라면 이렇게 참담한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리가 없어요. 서구의 기술적 지식이 분명 유용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소수의 사람만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토속 전통 문화의 지혜와, 지구 전체의 생존을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글로벌한 현상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기술의 진보가 하필 이 오만한 문화에서 이뤄졌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이뤄 내다니, 우리가 정말 최고야, 하느님도 우리랑 똑같은 영장류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하느님이 왜 영장류이겠어요? 산을 보세요. 바다의 고래를 보세요. 모두 다 살아 있는 것들인데 왜 하느님이 유독 영장류겠습니까? 오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중간 정도의 진화 단계에 와있는 주제에, 진화의 종착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구가 살아남을 길을 찾아 실행에 옮기려면 이걸 깨달아야 해요.
나는 스스로 하나의 모래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모래가 차이를 만듭니다. 모래알 하나가 들어간 신발을 신고 걸어 본 적이 있나요? 편하지 않지요. 내가 하는 일은 그처럼 작아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와있는 자리가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즐겁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쟁점화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에너지를 미래로까지 전해 줄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내 행동들은 무의미해요. 나의 세대하고만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도 늘 얘기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도 내가 이룬 것 중 쓸모 있을 만한 것이 눈에 밟히도록, 테크놀로지 측면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시위를 하면 잡혀 가고, 점심 먹으러 가도 여전히 유색인과 백인 줄이 따로 있는 세상입니다. 너는 패배했어, 하고 다들 말하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있어요. 식당 줄이 피부색으로 나뉘어 있다 뿐이지, 내가 패배한 게 아니란 걸 난 알아요. 사실은 이긴 거예요. 우리 문화는 매사에 빠른 대차대조표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소저너 트루스 보다 해리엣 터브먼 보다 해리엣 터브먼 이 더 멋있어요.” 나는 그러지요. “둘 다 죽었잖아? 둘 다 취해도 되는데 왜 하나만 골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의식이 있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잠이 들어도 좋고, 당장 죽어도 좋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뤄 놓기나 했는지 이러쿵저러쿵 말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한 알의 모래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 속 이 지구에서 받은 소명을 다했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싶고요. 이 더 멋있어요.” 나는 그러지요. “둘 다 죽었잖아? 둘 다 취해도 되는데 왜 하나만 골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의식이 있는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다 잠이 들어도 좋고, 당장 죽어도 좋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뤄 놓기나 했는지 이러쿵저러쿵 말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한 알의 모래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 속 이 지구에서 받은 소명을 다했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싶고요.
나는 흑인민권운동을 우리 시대의 ‘탄생’ 투쟁이라 부릅니다. 민권운동은 우리 시대에게 부자나 군인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믿고, 변화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돼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뭔가를 이뤄 놓은 것입니다. 실제 나는 젊을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려 애쓰며 살아 왔고, 그 잔물결이 퍼져 나가 다른 세대들도 거기서 취할 바가 있게 된 것을 보며 감회를 느낍니다. 지금 세대의 운동 방식이 우리 때와 다른 것도 좋아요.
노래를 잠깐 멈추고 객석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이 자그마한 이야기들을 나한테 해주기 시작하고 나는 듣고 있게 돼요. 나오는 얘기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열린 사람들인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늘상 듣는 얘기는, 음악의 감동은 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오더라는 말입니다. 예술을 통해 자기의 특정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나면, 삶에서 나의 지위는 바꾸지 못할망정, 그러한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없었던 에너지는 얻을 수 있어요. 보증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명백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그렇게 매번 새로이 창조되는 문화였으니까요.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다 하고 확신에 차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