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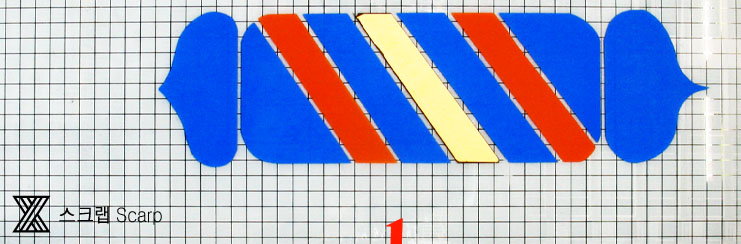
스크랩
"입시 짐 덜어내고, 두근거리는 꿈 얻었다"
조찬호 맛있는공부 기자 chjoh@chosun.com
대안학교 졸업생의 성공기
'나는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요?'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의 구절이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 '나의 꿈'에 대해 교실에서 발표해본 경험이 있다. 1970~80년대 아이들의 꿈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 음악가, 국군, 대통령 등 굵직굵직했다. 간혹 운동선수, 개그맨, 오락실 사장등 '별종' 직업을 언급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부모님에게 '커서 뭐 될래?'라며 혼쭐나기가 다반사였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어린이들이 연예인, 요리사, 만화가,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꿈을 얘기한다. 또 직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꽤 너그러워졌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입을 앞둘 즈음이면 자연스레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찾는 이들이 많다. 꿈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또 다른 꿈을 구상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꿈을 찾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은 세 명이 있다. 대안학교를 통해 꿈을 구체화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이들의 현재 행복지수는 100%에 가깝다.

-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신지예씨, 행복을 주는 제빵사가 꿈인 오세영씨,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이현주씨(왼쪽부터)./김승완 기자 wanfoto@chosun.com, 이경민 기자 kmin@chosun.com, 남정탁 기자 jungtak2@chosun.com
◆사회적 기업 CEO 꿈꾸는 신지예씨
신지예(20·하자작업장학교 졸업)씨는 현재 하자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한 사회적 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에서 공연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을 매개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연과 워크숍을 기획하고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한 번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던 신씨는 중학교 1학년 때 고민에 빠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를 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니 머리 길이에 제한이 생긴 것이었다. 선생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또래들과 학생 두발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신씨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찾기 위해 문화작업 교육 중심의 하자작업장학교를 선택했다. 학교 선택에서 진학까지 모두 스스로 정보를 찾고 검토해 결정했다. 그는 공연, 음악, 미술 등 학교의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았다.
그의 꿈은 "사회에 좋은 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대학보다는 현장이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씨는 몇 년간 현장 경험을 쌓고 덴마크의 사회적 기업가 교육기관인 카오스 파일럿에 진학할 계획이다.
신씨는 "요즘 가장 걱정스러운 건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한 친구에게 '꿈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결혼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라고 하데요. 친구들이 가슴속에 자신을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 하나씩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케이크 공장 공장장 꿈꾸는 오세영씨
가정 사정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오빠와 단둘이 살아야 했던 오세영(23·꿈틀학교 졸업)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 결국 고1 때 가족 몰래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피워 그만둘 때 말리는 선생님도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몇 달 뒤 자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에게 이끌려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꿈틀학교를 찾았다. 그는 "저도 일반 학교에서는 이상한 아이였지만, 친구들이 다들 독특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곳에 보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들을 보듬어주려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조금씩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무얼 하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무심코 들른 대학로의 자그마한 빵집에서 두근거림을 느꼈다. "가게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케이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곧 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과·제빵 분야를 알아봤고 유명 제과점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쳤다. 졸업 후 학원에서 제과·제빵을 배운 뒤에는 '인도(人道) 베이커리'(길거리에 있다고 해서 동네 빵집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다)에 들어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올해 베이커리 체인점 파리바게뜨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오씨의 꿈은 10년 뒤 자신만의 가게를 내는 것이다. "맛있는 빵이 나왔을 때, 내가 만든 케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지는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왕이 되고 싶다"고 했다.
◆란제리 디자이너 이현주씨
프랑스 패션 전문 교육기관 '에스모드 파리'의 한국 분교인 '에스모드 서울' 란제리과를 수석 졸업한 이현주(24·간디학교 졸업)씨는 특전으로 세계적인 란제리 디자이너 샹탈 토마스의 파리 디자인실에서 인턴십을 마쳤다. 현재는 공모전을 통해 국내 란제리 업계 1위인 신영 와코루에 스카우트돼 근무하고 있다.
중학교 때까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그는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옷 만들기 수업'을 통해 처음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자신이 교육과정을 설계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간디학교의 독특한 수업 방식은 이씨에게 큰 힘이 됐다. 마음이 맞는 친구 셋이서 동아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이씨는 학교에 '옷 만들기 심화과정' 개설을 요청했고 학교는 전문 디자이너와 연계해 이들을 지원했다. 이씨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한 친구는 올해 한국 패션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또 다른 친구는 파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활동 준비 중이다.
이씨는 "자유롭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학교 분위기가 나의 재능을 찾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수업 중 '산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시간을 그저 놀면서 보낼지, 책을 읽을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지는 학생의 자유지만, 스스로의 결정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이에요"라고 했다. 특히 "공부가 싫어서 대안학교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Please consider the planet before printing this post
hiiocks (hiiock kim)
e. hiiocks@gmail.com
w. http://productionschool.org, http://filltong.net
t. 070-4268-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