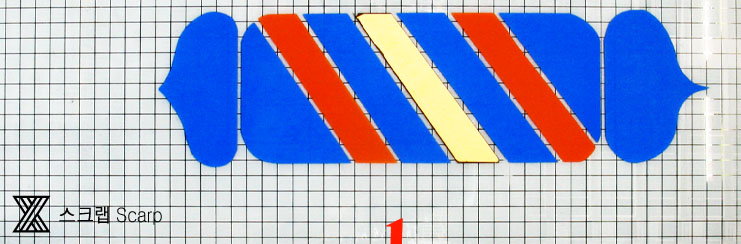[이뉴스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 ‘빚’이 문제다. 최근 공식적인 집계로 정부부채 407조원 이외에 공기업과 공적금융회사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7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이같은 빚은 우리나라 GDP의 70라는 집계가 나와 충격을 던졌다.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분식(?)해서 만든 수치, 정부부채 400조원은 GDP의 30% 수준이니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불안하고,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다.
그중 공기업들의 부채 내용과 규모, 성격을 살펴보면 ‘빚’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공기업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400조원에 이르는 정부부채의 50%를 차지한다. 규모도 놀랍지만 증가속도에 기가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말 138조4000억원이었던 공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무려 73조3000억원이 늘어난 211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또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32%였던 공기업 부채비율은 1년만에 20% 급증해 2009년말 152%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LH공사의 경우로 부채비율이 무려 524%로서 파산상태다.
또 부채의 성격도 큰 문제다. 4대강 사업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말 1조9000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 3조원에 달했다. 불과 1년만에 빚이 무려 52.7% 급증한 것이다. 원인은 국자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책사업 시행을 공기업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눈가림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공기업의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 직접채무인 308조원 이외에 사실상의 국가부채(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공적 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공기업 부채 등) 를 포함하면 1,439조원에 다다른다”면서 “특히 4대강, 녹색성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퍼주는 행태가 노무현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급기야는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등이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성 지적을 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4~26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한국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무디스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질문과 더불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기획재정부 설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LH공사,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빚’은 개인부채의 사회적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부채만 해도 700조원에 이른다. 금융권 이외의 사채 들 빚을 감안하면 가구당 개인부채 규모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동산 부문과 연결된 담보대출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부문 재정부실도 국가부채 못지 않은 국가적 문제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빚쟁이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며 ‘나라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부가감세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감소, 4대강 사업 올인에 따른 재정건선성 악화와 공기업 파산상태, 부동산 정책 문제에서 비롯한 개인부채 증가 등 나라가 온통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만 태평이다.
4대강을 온통 파헤쳐 놓고 정권이 끝나면 피해는 후손들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처럼, 천문학적인 국자부채, 공기업 부채 역시뒤치다꺼리는 후임 중권과 국민이 해야 한다. 그것은 곧 국가경영의 실패를 의미한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