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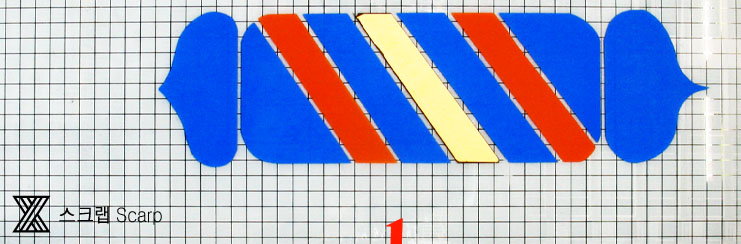
스크랩
글 수 351
카이스트에서 또 한 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이다. 이 4번째의 죽음이 있기 전 학교에서는 학생들 전원을 심리검사하고 체육활동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여론이 들끓고 급기야 4번째 학생이 목숨을 끊고서야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징벌 등록금 제도의 폐기를 선언하고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그 대화는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서남표 총장 취임 직후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는 없고 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정말 이게 소통의 문제인가? 소통을 잘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서 총장의 ‘선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물론 그 대화는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서남표 총장 취임 직후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는 없고 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정말 이게 소통의 문제인가? 소통을 잘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서 총장의 ‘선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고통을 당한 자와 고통, 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은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고통에 대한 공감이 배제된 공동체, 여기가 인간의 사회인가? 이것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모욕적인 고통, 고통스러운 모욕이다.
그렇기에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자신의 고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모욕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몽매한 사회는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입을 연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은 죽은 이가 아니라 그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이것을 몰랐다. 인간이 자존감의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 인간이란 뒤에서 열심히 채찍을 휘두르면 두려움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2009년 카이스트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번처럼 학내 구성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자는 제안도 없었다. 그 학생의 선의가 단지 소통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고소했다.
그것은 명예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존감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카이스트에는 단 한 명의 인간만이 존재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카이스트만의 문제인가? 한국에서 가장 특별하다면 특별한 대학인 카이스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대다수가 공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모욕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When we meet a desert, make it a garden.










